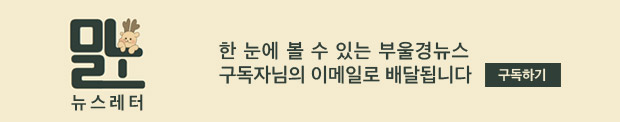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이름은 ‘스푸트니크 V’이다. 스푸트니크는 구 소련이 1957년 10월 4일 쏘아 올린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이름이다. 당시 냉전 체제에서 소련과 우주개발 경쟁을 벌이던 미국은 ‘스푸트니크 쇼크’에 빠졌고, NASA(미국항공우주국)라는 우주개발을 위한 전담기구까지 만든다.
하지만 기세를 올린 소련은 틈을 주지 않는다. 1959년 루나 3호의 달 순회 비행 성공, 1961년 4월 12일 최초의 우주선 보스토크 1호 발사까지 ‘3 연타석 홈런’을 쳤다. 보스토크호를 타고 108분간 지구를 한 바퀴 돈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사가 유리 가가린이다. 가가린이 1968년 3월 27일 막바지 훈련을 하던 중 불의의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미국 아폴로 11호와 닐 암스트롱 일행의 최초 달 착륙(1969년 7월 20일) 기록도 의미가 퇴색했을지 모를 일이다.
치열한 우주 개발전의 이면에는 대륙간미사일 등 군사적 의미가 짙게 도사리고 있었다. 한국의 우주개발이 1992년 ‘우리별 1호’에 와서야 시작된 것은 군사적 이유가 컸다. 1978년 박정희 정부가 ‘백곰’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자 미국 카터 행정부가 펄쩍 뛰었다. 결국 1979년 9월 ‘한미 미사일 지침’이 맺어졌고,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으로 제한됐다. 이후 42년 동안 우주개발은 걸음마 수준을 면치 못했다. 그런 미사일지침이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때 폐기되면서 우주를 향한 꿈도 날개를 달게 됐다.
그래서 지난 1일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 우뚝 선 최초의 한국형발사체(KSLV-Ⅱ) 누리호의 위용이 남다르다. 2013년 한국 최초 발사체인 ‘나로호’는 러시아산 엔진을 탑재하고 있었지만 마침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를 갖게 됐다. 미국 러시아 등에 기대지 않고 우주로 가려면 자체 운송수단이 필수다. 게다가 플랫폼 역할을 하는 제2 발사대 역시 완전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니 더욱 고무적이다.이제 10월 말 누리호 발사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섰다! 누리호”를 넘어 “떴다! 누리호”의 함성이 터진다면 내년 7월 최초의 달 궤도선 발사, 2030년 달 착륙까지도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다. 우리라고 미국의 ‘스페이스 X’ 같은 우주여행사를 못 가질 이유가 없고 가족 동반 우주여행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인류 최초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의 의미가 러시아어로 ‘여행의 동반자’라는 점을 상기해보자. 우리도 우주를 향한 인류의 꿈 실현을 위한 선의의 경쟁에 ‘동행’하는 시대가 됐다.
이승렬 논설위원 bungse@kookj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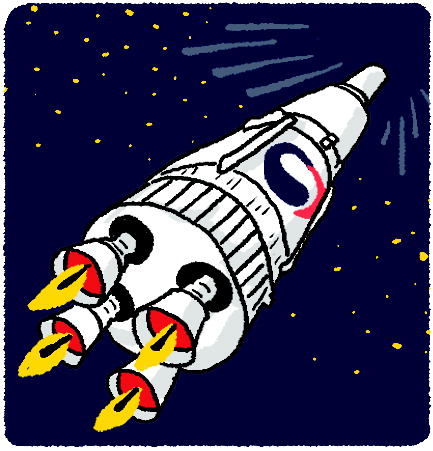 |
치열한 우주 개발전의 이면에는 대륙간미사일 등 군사적 의미가 짙게 도사리고 있었다. 한국의 우주개발이 1992년 ‘우리별 1호’에 와서야 시작된 것은 군사적 이유가 컸다. 1978년 박정희 정부가 ‘백곰’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자 미국 카터 행정부가 펄쩍 뛰었다. 결국 1979년 9월 ‘한미 미사일 지침’이 맺어졌고,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으로 제한됐다. 이후 42년 동안 우주개발은 걸음마 수준을 면치 못했다. 그런 미사일지침이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때 폐기되면서 우주를 향한 꿈도 날개를 달게 됐다.
그래서 지난 1일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 우뚝 선 최초의 한국형발사체(KSLV-Ⅱ) 누리호의 위용이 남다르다. 2013년 한국 최초 발사체인 ‘나로호’는 러시아산 엔진을 탑재하고 있었지만 마침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를 갖게 됐다. 미국 러시아 등에 기대지 않고 우주로 가려면 자체 운송수단이 필수다. 게다가 플랫폼 역할을 하는 제2 발사대 역시 완전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니 더욱 고무적이다.이제 10월 말 누리호 발사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섰다! 누리호”를 넘어 “떴다! 누리호”의 함성이 터진다면 내년 7월 최초의 달 궤도선 발사, 2030년 달 착륙까지도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다. 우리라고 미국의 ‘스페이스 X’ 같은 우주여행사를 못 가질 이유가 없고 가족 동반 우주여행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인류 최초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의 의미가 러시아어로 ‘여행의 동반자’라는 점을 상기해보자. 우리도 우주를 향한 인류의 꿈 실현을 위한 선의의 경쟁에 ‘동행’하는 시대가 됐다.
이승렬 논설위원 bungs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